[김환영의 글로벌 인터뷰]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의 저자 기 소르망
[중앙일보] 입력 2014.05.10 00:53 / 수정 2014.05.10 00:53
한국은 인정사정없는 사회다

김환영 논설위원
기 소르망은 세계적인 공공 지식인이다. 정치사회학·경제학·비교문명학 분야에서 18개 언어로 번역된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다.
최근 우리말 번역본이 나온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Le coeur americain)』은 미국의 기부문화·박애주의를 다뤘다는 점에서 연구 방향이 새롭다.
소르망은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각별하다. 기부란 무엇이며 한국에 선진 기부문화를 어떻게 이식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를 인터뷰했다.
소르망은 “이 책을 쓰기 전까지는 사회를 보는 내 시각이 근시안적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달 3일의 인터뷰 요지.
- 왜 박애인가.
“정부·시장·박애(philanthropy)는 사회의 3대 기둥이다. 시장과 정부는 각기 이윤과 권위의 영역이다. 하지만 선의(goodwill)에 바탕을 둔 박애 또한 삶의 중심이다. 박애는 미국 경제의 10%를 차지한다.시간이나 돈을 기부하지 않는 미국인은 미국인이 아니다. 유럽의 복지국가는 박애 부문을 파괴했다.복지국가가 파산한 지금, 박애를 재발견하고 복원해야 한다.”
- 박애가 한국에는 어떤 적실성이 있나.
“한국도 복지국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박애가 필요하다. 한국은 정부·기업·박애 중에서 정부·기업은 잘 발달했다.
박애가 약하다. 한국은 대기업이 박애를 주도하고 있는데, 홍보전략 차원의 박애는 진정한 박애가 아니다.개인이 나서야 한다. 문제는 정부가 개인을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박애를 발전시키려면 세제혜택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겸손해져야 한다.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한국은 경제성장기에 모두가 부의 축적에 몰입하는 가운데 ‘인정사정없는(brutal)’ 나라가 됐다.
사회가 분열됐다. 사회적 연대(solidarity)가 없다. 아무도 소외계층을 진정으로 걱정하지 않는다.
한국의 문화, 기독교와 불교에는 박애의 바탕인 후함(generosity)의 전통이 있다.
한국은 이제 박애로 사회적 연대를 복원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단계에 돌입했다.”
- 국가가 못한 것을 박애가 이룰 수 있나.
“박애의 좋은 점은 완벽하게 개인의 선택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다.
예컨대 야생 거위를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오늘날 사회는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박애 부문의 비정부기구(NGO) 단체들뿐이다.
영국 총리 처칠은 “여러분은 실패할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은 실패할 권리가 없다. 성공할 의무만 있다. 마약중독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실패하면 정부는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다. 고작 ‘예산이 부족했다’고 변명한다.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을 상상력이 없다. 기업도 주주들에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고 말할 수 없다.
조지 소로스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내가 틀리는 경우는 있다’라고 우긴 바 있다.”
- 박애 문제가 대두될 때 한국에서는 프랑스어 표현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를 자주 인용한다. 프랑스에서도 그런가.
“그렇다. 미국은 약간 다르다.
프랑스 사람이 사업으로 성공하면 ‘내가 최고라서 성공했다. 박애 활동에 돈을 좀 내놔야겠다’고 생각한다.성공한 미국인들은 ‘나는 운이 좋았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고 생각한다.”
- 그런 행운 관념의 유래는?
“칼뱅주의다. 박애 부문은 칼뱅주의의 영향권인 미국과 북부 유럽에서 강하다.
뱅주의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것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신(神)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 가톨릭 사회에서도 자선이 중시되는데.
“자선(charity)과 박애는 다르다.
자선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에 따르면 박애의 목적은 사회 시스템을 바꿔 가난을 없애는 것이다.
박애는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라고 믿지 않는다.
프랑스에서 자선 사업이 퇴조한 이유는 두 가지다. 자선은 사회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다.
또 19세기 중엽부터 강력해진 사회주의는 자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 복지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물고기를 주는 게 자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게 박애인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 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빈민을도우면 그들이 노력하지 않기때문에 오히려 가난에서벗어나지 못한다는주장이 19세기에 팽배했다.
틀린 생각이라는 게 여러 연구로 밝혀졌다. 가난이 좋아서 자의로 가난한 사람은 없다.
마크 트웨인은 부자들이 명성을 얻고자 기부한다고 비판했다.
도서관·박물관에 새겨진 기부자의 이름은 ‘부자들의 낙서(the graffiti of the rich)’다. 앤드루 카네기는 1800개의 도서관을 건립했다. 카네기는 죽었고 그가 만든 도서관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과 허영심이 공존하는 게 사람이다. 의도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
김환영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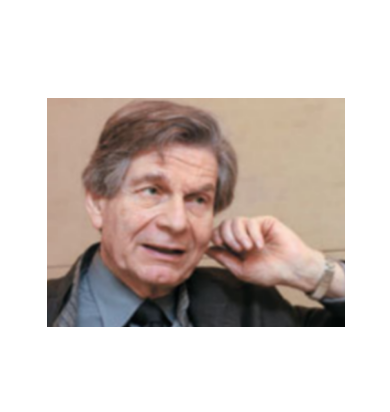
책소개
미국의 노브레스 오블레주, 기부문화의 본질을 다방면으로 분석하다.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은 프랑스 사회학자인 저자 기 소르망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미국에 머물며 미국 기부문화에 대한 취재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 기부문화의 실상과 허상을 분석하여 기부 문화의 명암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미국의 기부문화의 진실 뿐 아니라 빈부격차, 공교육 부실 등 현실적인 문제를 공개하며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
미국은 어려서부터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몸에 배도록 교육을 받고 실천해 왔다.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부는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다. 기 소르망 교수는 박애적 기부를 통해 슈퍼리치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는 미국 정신문화적 전통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모든 기부 활동이 옳은 것은 아니다. 어떤 정치인이나 유명인, 기업인들은 자신의 이미지를새롭게 창출하거나 실추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기부를 하기도 한다. 또한 기부를 받는 사람만큼 베푸는 사람에게도 사회적, 인간적, 정신적 혜택이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기부의 두 얼굴을 보여준다.
저자소개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목차
1,
기부예찬 - 12
자원봉사 - 23
월 스트리트에서 할렘으로 - 39
2,
사회적기업가 - 56
양자혁명 - 78
슈퍼리치 - 94
3,
댈러스 - 112
십일조 - 124
교회가 국가를 대신할 때 - 137
4,
정가 지불 문화 - 156
조세 피난처 - 176
멜팅 포트 수정하기 - 195
5,
쇼를 위한 기부 - 218
자본주의에 윤리를 더하다 - 244
착한 명분 나쁜 명문 - 260
6,
싱크탱크 - 282
선의 제국 - 302
새로운 발상 - 326
출판사 서평
이 책은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기 소르망이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1년 동안 미국 현지에 머무르면서 미국의 기부 문화에 대해 샅샅이 취재한 기록을 담고 있다. 그는 미국 기부문화의 기원과 현주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실상과 허상을 분석해 미국 기부 문화의 명암을 심층적으로 조명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기부문화의 진실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나 공교육의 부실 등 미국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게 한다.
1. 미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라”
미국은 기부의 천국이다. ‘기부하지 않으면 미국인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그들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공교육을 바꾸고, 소외계층의 사람에 변화를 주는 등 사회 변혁을 이루어왔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추신수 선수는 1억 3천만 달러라는 대형 계약을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계약 뒤에 숨겨진 기부에 대해 밝혀 또 한 번 주목을 받았다. 추신수는 “많이 버는 만큼 많이 내야 한다”며 미국 특유의 기부 문화에 대해 “텍사스 같은 경우 1억 달러를 계약했을 때 자동으로 100만 달러(한화 약 10억) 기부하는 게 옵션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계약금의 1%가 자동 기부되는 것이다.
미국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교육을 받고 실천을 해왔다. 기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무이고 책임인 것이다. 일찍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록펠러, 포드 등 미국 사회의 기초를 다진 인물들에서부터 조지 소로스, 워렌 버핏, 빌 게이츠까지 성공한 미국인들이라면 거의 모두 거액의 기부자금을 가지고 기부재단을 설립한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열정은 성공의 열쇠이며, 성공의 완성은 나눔이다.” 또한 빌 게이츠는 “사회로부터 얻은 재산을 다시금 사회에 돌려주는 것이 기부 운동에 참여하는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 12월, 1조 원에 해당하는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실리콘밸리 커뮤니티 재단’에 기부했다. 미국의 슈퍼리치들은 자신들의 부를 대물림하는 데 집착하기보다는 사회 환원에 더 적극적이다.
이렇듯 기부는 미국 문화와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미국인들은 후원금이나 자산 기부 등 금품기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하략)
'배움-공부 > -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갈 거라고? (0) | 2019.10.01 |
|---|---|
|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한다 내 삶의 주인이되는 문화심리학 (0) | 2016.02.11 |
| 혼자 있는 시간의 힘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0) | 2016.01.31 |
|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시간 (0) | 2016.01.29 |
| 치열한 속도사회서 자기중심 잡는 비법있다 (0) | 2016.01.07 |



